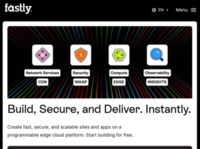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주택시장에 해외 자금이 밀물을 이루고 있다.
달러화 상승과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시세차익까지 세 마리 토끼를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20일(현지시간) 투자은행 브루예티 앤 우즈에 따르면 미국 임대용 주택 매입을 위해 기관 투자자들이 모집한 자금이 최대 9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외 자금이며, 그 비중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QE)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주택 경기 회복 조짐이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동시에 얻는다는 것이 해외 투자자의 노림수다.
여기에 해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가 평가절상된 국가의 투자자들은 높은 매수호가를 제시해 경쟁력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율 등락에 따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호주 투자자들이 이 같은 논리로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카셀 USA 프로퍼티 파트너스의 스튜어트 모튼 디렉터는 “호주 투자자들에게 미국 부동산 시장 투자는 거의 전적으로 외환 시세 차익을 얻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호주 달러화 상승으로 인해 이중으로 할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주 투자회사 USA 마스터는 앨런 딕슨 매니저는 “미국 주택 임대 포트폴리오에서 모든 운용 비용을 차감한 수익률이 7%에 이른다”며 “미국 달러화의 상승으로 주택을 처분할 때 30%를 웃도는 수익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미국 주택시장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미국 달러화 대비 캐나다 달러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들도 일석삼조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트리콘 캐피탈 그룹은 2012년 이후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2000여 채의 주택을 매입, 8~9%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올해 말 보유 주택 규모를 최대 4000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통적으로 주택 임대는 미국 개인 투자자가 중심을 이뤘으나 약달러와 주택시장 회복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이 핵심 세력으로 본격 부상하는 움직임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