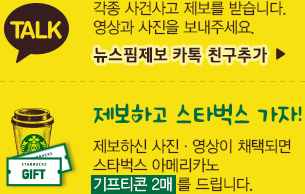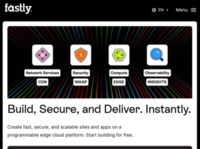디지털·글로벌·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젊은 리더십 '시험대' 올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식품 오너가(家) 3·4세들이 그룹의 신사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보직에 오르며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가 겹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책임질 젊은 리더십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CJ 4세' 이선호, 미래기획그룹장 맡아...경영 전면에
19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전날 조직을 개편해 '미래기획그룹'을 신설하고,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미래기획실장(1991년생, 34세)을 초대 그룹장으로 앉혔다.
미래기획그룹은 기존에 분리돼 있던 미래기획실(중장기 전략·신수종 발굴)과 DT 추진실(디지털 전환)을 하나로 묶은 조직으로, 앞으로 그룹의 미래 먹거리·글로벌 전략·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
1991년생인 이선호 미래기획그룹장은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을 지내며 글로벌 식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신사업 모델 육성을 주도해 왔다. 지난 9월엔 지주사인 CJ로 6년 만에 복귀해 그룹의 신사업을 주도하며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다만 이번 신임 경영리더 승진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성과가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만큼, 그룹이 승계 작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부터 미래 먹거리 발굴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맡은 만큼 향후 1~2년 간 성과가 이 그룹장의 리더십을 입증할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삼양식품 전병우·SPC 3세도 나란히 승진
삼양식품은 최근 오너 3세인 전병우 COO(31세·1994년생)를 전무로 승진시키며 해외 사업과 신사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전병우 신임 전무는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인 오너 3세로, 올해 31세다. 2021년 입사 이후 4년 만에 전무로 고속 승진했으며, 상무 승진 후 불과 2년 만의 발탁이다.
전 전무는 해외사업본부에 입사한 뒤, 중국 자싱공장 설립을 주도하고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끌어낸 실적을 인정받았다. 삼양식품은 전 전무에게 향후 글로벌 시장 확장과 신사업 투자 전략을 맡기며, 그룹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SPC그룹 역시 최근 임원 인사를 통해 허영인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허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은 1977년생(48세), 1978년생(49세)으로 연년생이다.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은 각각 2005년, 2007년 상무로 입사해 허영인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그룹 성장에 힘을 보태왔다. 허 부회장은 파리바게뜨 글로벌BU를 총괄하며 해외사업 확장을 책임져 왔고, 그룹 쇄신 기구인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을 맡아 안전·품질 체계 개편도 지휘했다. 허희수 사장은 배스킨라빈스·던킨의 제품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의 아시아 첫 론칭을 성사시키는 등 신사업 부문에서 성과를 내며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 사업 책임진다"
이처럼 식품업계 30·40대 차기 후계자들을 미래 먹거리 사업에 전면 배치하는 흐름은 과거 오너 2세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다. 오너 2세 때만 하더라도 실적이 안정적인 계열사나 지주사 비핵심 부문을 맡아, 흠결 없는 리더. 유통 대기업 중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신 회장은 일본 노무라증권과 일본 롯데상사를 거쳐, 당시 그룹 내 실적이 가장 좋던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상무로 입사하며 한국 롯데그룹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부사장과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책본부장을 거쳐 2011년 회장직에 올랐다. 당시 재계 안팎에서는 "차기 후계자의 리더십에 흠결이 생기면 승계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계열사에 오너 2세를 보내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수 침체, 환율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룹 생존 전략의 중심이 '미래 먹거리 발굴'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후계자들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핵심 부문에 투입돼 신사업·글로벌 전략에서 숫자로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경영 시험대'에 서고 있다는 점이, 오너 2세와 3·4세 간 승계 방식의 가장 큰 차이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승계의 명분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또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과 글로벌 감각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 유학 경험이 많은 오너 3·4세들이 경영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