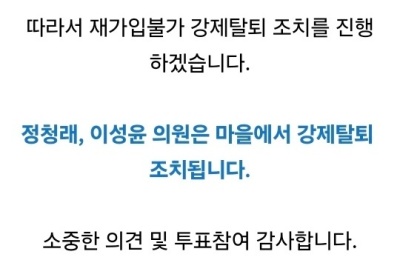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국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유럽연합(EU)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지난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의 1인당 GDP는 EU 회원국 27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피가로는 이날 EU 공식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4년 현재 프랑스의 1인당 GDP는 EU 전체 평균보다 2%포인트 낮은 98%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1인당 GDP가 유럽 평균보다 낮아졌다"며 "유럽에서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유럽의 평균 시민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놀라운 몰락"이라고 했다.
EU 평균을 100%로 봤을 때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프랑스의 2배 이상 수준인 245%를 기록했다. 이어 아일랜드가 221%, 네덜란드 160%, 덴마크 127%, 오스트리아 119%, 벨기에 117% 등이었다.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두 기둥으로 불리는 독일은 116%였고, 이탈리아는 101%였다.
가장 낮은 나라는 불가리아로 66%로 평가됐고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68%, 그리스는 69%였다.
IESEG 경영대학원의 에리크 도르 교수는 "이 순위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계산해 국가별 물가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며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별 국민 생활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다.
1인당 GDP의 상대적 악화는 장기적인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의 1인당 GDP는 1975년에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격차가 1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1975년 당시 1인당 GDP가 프랑스보다 13%포인트 높았던 덴마크는 차이를 거의 30%포인트로 벌렸다.
프랑스 경제동향관측소(OFCE) 부소장 마티외 플란은 "프랑스 경제가 2000년대 이후 크게 두 차례 큰 하락세를 겪었다"고 했다.
첫 번째 시기는 2013∼2017년으로 109%에서 103%로 뚝 떨어졌다.
플란 부소장은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이 생산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급 중심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세액공제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들이 기대했던 성장 반등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두 번째 시기는 2020년대 들어서였다. 2020년 104%, 2021년 101%로 하락세가 이어지다 2022년 들어 97%를 기록해 EU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고질적인 문제로 일자리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도르 교수는 "2024년 프랑스 인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고용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슬로바키아와 벨기에를 제외하고 프랑스보다 상황이 더 나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프랑스가 인구학적으로 EU 27개 국가 중 20~6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체된 생산성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생산성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년째 생산성 향상이 정체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채가 거의 3조5000억 유로에 달하고 1년치 재정적자가 GDP 대비 5%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를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