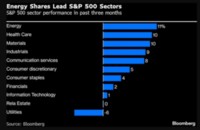대부분의 사오십 대 가장은 ‘을이거나 노예’의 삶을 산다. 자식들 때문이다. 한 낮의 열기가 남아 후끈한 신도시의 아스팔트 밤 9시, 퇴근길 버스에서 내려 큰길 가 횡단보도를 건너자니 남루한 아저씨 둘이서 보도블록 바닥에 그릇을 놓은 채 엉거주춤 앉아서 자장면을 먹는 중이다. 대단하지도 많지도 않은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았다. ‘3천원, 5천원’이라 비뚤배뚤 매직으로 쓴 골판지 쪼가리가 옷걸이에 붙어있다.
두 개의 자장면 그릇 사이에 놓인 후줄근한 단무지 한 접시, 밥상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장면이다. 아버지가 뭐길래, 가장이 뭐길래… … 무거운 마음으로 걷다가 뒤돌아 서서 그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담아 아주 잠깐 목례를 보냈다. ‘아버지’라는 단어 결단코 ‘어머니’보다 가벼울 리 없다. 바라건대 혼신의 힘을 다해 당신들이 지키려는 당신들의 가정이 비둘기처럼 다정하기를! 장미꽃 넝쿨이 우거지기를!
필자는 박재동 화백을 1980년대 후반에 신문을 통해 알았다. 날마다 그의 한 컷 시사만화-영어로는 커툰-를 보면서 ‘만화도 이렇게 천재적으로 그릴 수 있구나’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래서 서평 쓸 때 ‘개인적으로 한국의 시사만화는 박재동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박재동 이전의 시사만화가 중에 이 평이 섭섭하다 해도 그 이전에는 신문을 제대로 보지 못해 시사만화의 존재를 몰랐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라’고 쓰기로 미리 마음 먹었다. 그런데 책 머리 저자 소개에 이미 그런 평가가 ‘세간의 평’을 빗대 인쇄돼 있었다. 세간의 평과 필자의 평이 같았음을 밝히기 위해 굳이 이렇게 써 놓는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부산의 변두리에서 만화방과 문구점, 김밥, 오뎅 장사로 세파를 견뎌 낸 ‘박일호, 신봉선 부부’의 20년 기록이다. 박재동 화백의 아버지(이하 아버지)는 원래는 중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때는 선생님 자원이 딸려서 그게 가능했다. 아버지는 학도병과 카투사로 군대를 두 번이나 갔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일하다 폐병에 걸려 학교에서 쫓겨난다.
‘근엄하신 선생님에서 환자와 백수’로 전락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2남 1녀의 자식들 양육을 위해 밑바닥 생활전선에 뛰어든다. 선생님이었던 울산에서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단칸 셋방을 얻어 부산으로 이사하면서다. 그로부터 전쟁처럼 벌어지는 ‘생활전투, 변화하는 세상의 기록’을 아버지는 이어나갔다.
50대 남자인 필자, 눈물이 자주 앞을 가려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일기가 그저 눈물샘이나 자극하는 신파조라서가 아니라 화백의 아버지에 필자의 아버지가 페이지 페이지 겹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난한 만화방 아저씨의 성공 스토리로 읽으면 하수, 시대불문 변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으로 읽으면 중수, 지금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장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반성하면 상수, 가족을 위해 뭐 한가지라도 고치려 마음 먹으면 고수다.
<1971.4.7 수. 맑음> 처음 부산에 와서 아무 장사든 무턱대고 했다. 선생님, 부르는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건만 이 몸은 아이스케키 통을 둘러메고 골목길을 걸었다. 우리 생활과 내 약값을 위해 과거는 잊으려 했고, 현실에만 급급했다.
<1972.2.4 금. 흐림> 아내는 불량만화 단속에 걸려 파출서에서 밤을 지새운다. 가장인 내가 의당 가야 하는데 환자의 몸이라 아내가 서슴지 않고 나섰다. 아내를 파출소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발걸음이란 정말 허전하다. 아내는 파출소 나무 의자에서 밤을 지새고, 세끼를 굶고, 차멀미까지 시달려 까맣게 되어 돌아왔다. 재동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 (어머니) 그때 나는 크게 소리 지르고 싶었다. 만화방 아이도 서울대학 붙었다고.
<1976.6.24 목. 갬> 오늘 밤도 아내는 마지막 청소를 하다가 심한 두통(수면 부족)으로 쓰러졌다. 아내는 1인 3역을 하느라 아직도 짐이 무겁다. 우리의 고된 생활이 보람으로 맺어질 그날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지.
<1981.2.20 금. 흐림> 재동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10만원 정도 송금해 달라고 한다. 현재 통장에 돈이 없으니 걱정이다. 어떻게든 구할 길이 있겠지.
<1983.2.6 일. 맑음> 막내 딸이 병원으로 면회를 왔다. 병환 중에 자식들의 건강을 기원해 보지만, 바라는 정도로 건강한 몸들이 아니라 걱정이다. 우리나라에 올림픽 금메달을 처음 안겨 주었던 양정모 레슬링 선수를 환영하는 부산의 범 시민 대회는 1976년 8월 6일 비 오는 금요일에 열렸었다. 부산에 분뇨처리장에 문제가 생겨 분뇨수거차가 오지 않은 바람에 생긴 ‘부산 분뇨대란’은 1979년 1월 26일, 흐린 날의 일이었다. 골목에서 만화방, 문구점, 오뎅, 김밥을 팔면서 숱한 경쟁자들을 헤쳐 나가는 ‘현장의 생생한 마케팅 기법’은 덤이다.
우리나라에 올림픽 금메달을 처음 안겨 주었던 양정모 레슬링 선수를 환영하는 부산의 범 시민 대회는 1976년 8월 6일 비 오는 금요일에 열렸었다. 부산에 분뇨처리장에 문제가 생겨 분뇨수거차가 오지 않은 바람에 생긴 ‘부산 분뇨대란’은 1979년 1월 26일, 흐린 날의 일이었다. 골목에서 만화방, 문구점, 오뎅, 김밥을 팔면서 숱한 경쟁자들을 헤쳐 나가는 ‘현장의 생생한 마케팅 기법’은 덤이다.
(화백의 아버지, 저자 고(故) 박일호 선생님께서는 1989년 61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필자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때도 그 정도 나이의 그 즈음이다.)
최보기 북컬럼니스트(thebex@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