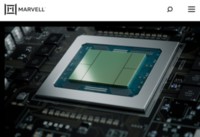[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마통(마이너스통장) 뚫어 투자했는데 공모주는커녕 이틀 치 이자만 나갔다."
올해 초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지인의 하소연이다. 지난 1월 진행된 엔비티의 공모청약 경쟁률은 4397대 1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4000만 원대 청약증거금을 넣고도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1억 원대 자산가도 2~3주 배정에 그쳤다. 한마디로 역대급 경쟁률이었다.
 |
엔비티의 청약 경쟁률은 국내 공모주 광풍의 단면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 진행된 첫 공모청약에 투자자들은 또 다시 '상승 랠리' 기대감을 담았다. 지난해 공모기업들의 상장 후 수익률이 짭짤했던 영향이다. 총 76개사(스팩 제외)가 상장한 가운데 36% 수준인 26개사는 시초가부터 공모가의 2배 수익을 냈다. 유동성 장세에 공모주 투자는 '두 배 되어라 뚝딱'이 가능한 도깨비 방망이였던 셈이다.
문제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기 위한 자격이다. 공모주 투자가 인기를 끌며 1주를 쥐기 위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졌다. 고액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비례배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결국 금융당국은 소액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1월 말부터 본격 도입됐다. 공모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액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최소한의 증거금으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무리하게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와 '영끌'할 필요도 없다. 다만 단순히 많은 돈을 넣어 원하는 주식 수를 얻어냈던 과거와는 셈법이 달라졌다. 계좌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노부모와 어린 자녀의 차명계좌까지 만든 '계좌 부자'가 돈을 번다. 신규고객 모집에 계좌당 공모청약 수수료까지 챙기는 증권사도 슬며시 웃는다.
돈을 벌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려는 마음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증시 유동성이다. 유동성장세의 끝자락이 보일수록 공모주의 인기도 어느 순간 사그라들 수 있다. 당장 일부 새내기주들은 상장과 동시에 공모가를 밑돌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고, 중복청약의 투자위험도 배로 커진다.
하루 빨리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들은 '나만 손해볼 수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모주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청약을 위해 주관사와 인수단 계좌 6개를 모두 만든 투자자들도 적잖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증권사마다 경쟁률도 조정되는 만큼 하나의 계좌를 통해 배정받을 수 있는 균등배분 주식 수도 많아질 것이다.
증권사별 공모청약 계좌수 공개도 중복청약 제한과 함께 고려돼야 할 과제다. 앞서 상장된 솔루엠의 경우 5곳의 증권사에서 공모청약을 받았지만, 균등배분 물량은 1주에서 5주까지 제각각이었다. 증권사별로 보유한 공모주 물량과 공모청약에 참여한 계좌수를 함께 고려해야 투자전략도 가능하다.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계좌수 공개 역시 꼭 필요해 보인다.
모든 시작이 그렇듯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새로운 공모주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투자자, 증권사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다만 불편함에 익숙해지면 더 나은 시도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를 위한 균등배분.' 애초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합리적인 공모주 배정과 투자자 편의를 위한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을 기다린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