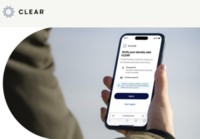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강소연 기자] ‘감시자들’ ‘스파이’ ‘소원’까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영화다.
지난겨울부터 줄이어 개봉한 영화 덕에 유독 볼 기회가 많았던 배우 설경구(45)와 또 한 번 마주했다. 분명 길지 않은 텀이었는데 설경구는 어딘가 변해있었다. 언제나처럼 소탈하고 유쾌했지만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설경구답지(?) 않게 돌아오는 반문도 많았다.
인터뷰 중간중간에는 슬픔이 밀려오는 듯 허공을 쳐다봤다. 영화에 대한 깊은 대화가 오갈 때면 딴말로 슬쩍 돌려버리기도 했다. 아직도 설경구의 마음 속에는 ‘소원’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다. 언론 시사회 때도 울컥 쏟아지는 눈물에 조금 일찍 자리를 떴던 그다.
“저 그날 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감정이 올라와서 도망나왔죠. 죽겠더라고요(웃음). 언론 시사회 전날부터 되게 날카로워졌어요. ‘타워’ ‘감시자들’ ‘스파이’ 때와 기분이 달랐죠. 소재가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찍었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영화를 보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영화보고 기분 나쁘진 않았죠?”

설경구는 조두순 사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에서 소원(이레)의 아빠 동훈을 연기했다. 사실 그는 이번 영화 출연을 많이 망설였다. 정확히 말하면 시나리오를 열어보는 것조차 꺼렸다. 배우이기 이전에 자식을 가진 아빠였기에 더욱 주저했다. 이런 설경구가 출연을 결정하기까지는 아내이자 동료 배우인 송윤아와 이준익 감독의 탁월한 말발(?)이 큰 몫을 했다.
“이 감독님이 이걸 왜 만들려는지도 모르겠고 화도 났죠. 잘못하면 감독님은 온갖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도, 영원히 영화를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시나리오도 우리 와이프가 먼저 봤어요. 불편한 영화가 아니니 읽어보라더군요. 초반엔 힘들었어요. 책을 세 번이나 덮었고 엄청 울었죠. 근데 영화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려 갔는데 말을 좀 잘해야죠(웃음). 거기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출연한다고 했어요.”
‘소원’은 설경구의 눈물을 쏙 빼놓은 영화지만 정작 영화 속 설경구는 단 한 번도 오열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딸의 곁을 지킨다. 딸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빠의 복잡한 심경은 오히려 그의 덤덤한 표정을 통해 관객을 울린다. 그것도 사정없이.
“모두가 카메라 안에서 감정을 눌렀어요. 배우가 먼저 선수 치면 보는 사람들은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되레 담담해져야 해요. 우는 건 관객 몫이죠. ‘소원’은 감독, 배우, 관객이 삼인일체가 되는 영화거든요. 배우가 참으면 관객이 요동치죠. 클라이맥스도 저절로 만들어지고요. 생각보다 관객이 많은 걸 해주더라고요.”

이제 뚜껑은 열렸다. 하지만 설경구에게는 아직 숙제가 남았다. 관객을 영화관으로 끌고 오는 게 개봉 후 그의 첫 번째 임무다. 따뜻한 영화임을 자신하지만 소재 자체에 지레 겁을 먹고 손을 내두르는 관객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나름의 전략을 묻는 말에 짧은 한숨을 내쉬던 설경구는 이내 영화가 가진 따뜻함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우리 영화는 피해자에게 동정을 바라지 않아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촬영하면서 감독님한테 ‘별거 아닌 일상이 되게 소중해요’란 말을 제 입으로 했다니까요(웃음). 큰 아픔을 겪으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하겠어요? 영화를 통해 그걸 느꼈으면 해요. ‘소원’은 울림과 희망의 여지가 있죠. 우리 영화가 원하는 건 피해자 가족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거든요. ‘따뜻하게 봐주세요. 속닥거리지 말아요’란 그들의 바람과 마음을 꼭 읽어주세요.”
“줄넘기와 빨랫비누? 연기 인생의 상징적 초심이죠.” |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강소연 기자 (kang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