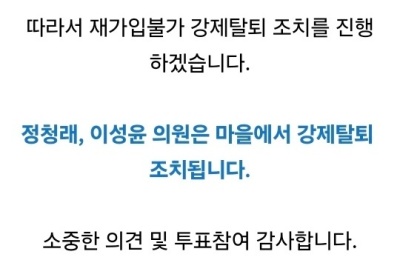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교과서 원리와 동떨어졌다는 것은 석학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특히 영국 경제에 대해 수수께끼라는 평가가 집중돼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5년간 영국 경제가 전통적인 원리에 입각한 전망과 어긋난 방향으로 움직였고, 최근 들어 이 같은 추이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경제 석학들은 영란은행(BOE)의 비전통적인 유동성 공급이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BOE가 사들이 국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지만 정작 생산 규모는 여전히 2007년 말에 비해 3% 낮은 실정이다.
위기 발생 이후 파운드화가 장기적으로 하락, 20%에 이르는 평가절하가 이뤄지자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수출 경기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실물경기가 뒷걸음질 칠 때 실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 인구당 생산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반면 영국의 실업률은 8% 내외까지 오르는 데 그쳤고, 생산성은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4.4% 낮은 상황이다.
실물경기가 부진할 때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석이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영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BOE의 목표 수준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실정이다.
영국 경제의 미스터리는 또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 영국 경제가 전분기에 비해 0.8% 성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최근 경제지표를 근간으로 할 때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5%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연초 이만큼 강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만한 경기 선행 지표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 경제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제시했다. 반면 이달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50% 높여 잡았다.
베렌버그 은행의 롭 우드 이코노미스트는 “갑작스러운 성장 회복이 어디에서 초래된 것인지 분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성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치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미국과 여전히 부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로존의 경우 금리인상 여지가 지극히 낮은 데 반해 선진국 가운데 영국이 먼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