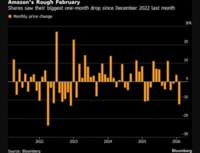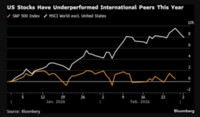[뉴스핌=김지완 기자] 중소형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적용된 신 NCR(순자본비율)로 인해 자기자본투자(PI)가 위축,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 NCR 제도가 대형사들의 위험투자에 대한 걸림돌은 완화시켰지만 중소형사에겐 IB업무를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NCR 산출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신NCR제도는 2015년 9개 증권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증권사 전체로 확대 적용됐다. 기존의 NCR제도가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PI투자, 인수금융 등 IB업무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제도개편의 목적이다.
◆ 중소형사 PI업무 올스톱 위기...규제도입 취지와 크게 어긋나
NCR제도 변경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희비는 크게 갈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구NCR을 적용받았던 2014년 12월말의 NCR 비율은 각각 407.83%, 551.73%였다. 불과 3개월 뒤인 2015년 3월 NCR 비율은 각각 888.58%, 801.79%로 증가했다.
반면, 2015년말까지 구NCR 비율을 적용받았던 케이프투자증권(구 LIG투자증권)과, 바로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등은 각각 628.35%, 740.18%, 667.52%에서 323.29%, 143.64%, 143.07%로 크게 떨어졌다.
 |
중소형사들은 신 NCR이 적용되면서 생존자체가 힘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중소형사 한 리스크관리 본부장은 “새로운 NCR이 도입되면서 ‘업무단위별 필요유지 자본’을 분모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는 사실상의 증권업 라이센스 비용과 동일한 개념”이라면서 “대형사의 경우 종합증권사면허 기준인 자본금 500억원이 신 NCR비율에서 분모가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NCR 비율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중소형사의 경우 위탁·자기매매업 면허기준이 자본금 200억원”이라면서 “전체 자본금이 300억원에 불과한데 200억원이 분모가 되면서, 우리 NCR 비율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게 됐고 결국 영업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I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형 증권사 투자기획부 과장은 “대형사들이야 돈이 많으니깐 PI를 이용해 CB에도 투자하고, 대출도 해주고, PF도 한다”면서 “반대로 중소형사들은 리테일 기반도 없고, 대출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200~300억원에 불과한 PI를 어떻게든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기업이 다음달 은행에서 100억원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2주 정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 “소위 브릿지자금 개념으로 과거 구NCR을 적용받을 땐 PI를 활용해 수수료 300bp에 연 8% 이상 고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브릿지 자금은 브릿지 이후에는 담보가 있고 구조가 확정돼 있지만, 그 전에는 담보가 없어 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중소형사 증권사들이 이런 브릿지자금에 PI 투자를 하면서 최소한의 영업환경이 갖춰졌는데 지금의 규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금융당국이 NCR 규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산방지를 위해 과도하게 증권사에 대한 자본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위험인수 기능과 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이는 증권사가 자본시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제도변경으로 증권업 전체가 위험해졌다는 비판까지 등장했다.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은 "금융회사의 NCR 개정초기에 금융사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도입 목적대로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NCR 개정으로 인해 대형사들은 더 위험에 노출됐고, 중소형사들에게는 영업규제가 심해져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졌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 대책 마련 못해...증자도 힘들어
중소형사의 경우 증자를 통해 NCR 비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 대형사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증자가 쉽고, 또 대부분 상장사로 유상증자가 가능하다”면서 “중소형사는 비상장에 유증이 쉽지 않고, 수익도 안나 대주주의 사재출연 아니면 사실상 증자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꼬집었다.
중소형사는 특히 금융당국의 제도개편 추세가 대형사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의 잣대가 됐던 구 NCR을 신 NCR 변경을 골자로 한 법안변경이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초대형IB 증권사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 증권사 리스크관리부장은 “국회 등 정치권은 대형사들 규제완화에는 발빠르게 대처하면서도 파생상품 면허도 없는 중소형사 생존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