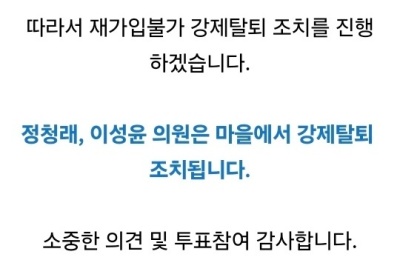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시장에 풀어, 일반주주보다는 대주주와 기업 이익으로만 가져가고 있다.

KCC는 지난 24일 4300억원 규모의 EB 발행 계획을 공시했다. 교환 대상은 총발행주식의 약 9.9%인 88만2300주였다. 발표 이후 KCC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주주들이 기다려 온 것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이었는데, 돌아온 건 EB를 통한 지분 희석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사주 또는 보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는 EB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소각 대신 EB를 선택하는 순간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 수가 증가해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약 3조3000억원의 저수익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4300억원 자사주 EB를 발행한 점은 주식 투자자 기준 이례적인 의사결정"이라며 "이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밸류업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 및 자본시장 움직임과 반대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기업 입장에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EB 발행이 늘면 주가가 내리고 국내 증시에는 무조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EB 발행이 과하게 유행처럼 퍼져버리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주환원이 한국 증시의 핵심인데 그걸 역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주주환원을 축으로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EB 발행이라는 우회로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증시 리레이팅 대신 투자자 신뢰 훼손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법안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퍼지기 전에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처분 결정을 공시한 기업들은 셀바이오휴먼텍, 테스, 에프에스티, 쿠쿠홀딩스, 삼호개발 등 벌써 26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인터로조 한 곳만 EB를 발행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