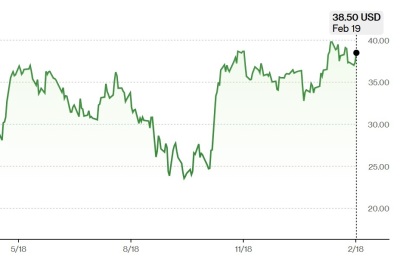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을 보면 감탄부터 나온다. 세계 랭킹 1위를 2년 4개월간 지키며, 올해에만 10승을 따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에 버금가는 리그 지배력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놀라운 성취 뒤에 묘한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렇게 잘하는데 상금은 고작 이 정도인가."
안세영의 시즌 상금은 100만 달러가 채 안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까지 나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이야기한다. 테니스나 골프 스타들과 비교하며 "말이 되느냐"고 묻는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스포츠 산업의 언어로 번역하면,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다. 상금은 존중의 표시가 아니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 상금은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크기에서 나온다
배드민턴은 유럽에서도 하는 글로벌 종목이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적이다. 월드투어 단식 우승 상금은 10만 달러에 못 미친다. 선수가 덜 위대해서가 아니다. 대회와 투어가 벌어들이는 재화의 총량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정규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쳐 상금만 4억 달러를 훌쩍 넘겼다. 메이저와 시그니처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5억 달러 이상이 풀린다.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20개 대회에 나가 27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출전 대회 당 평균 수입은 10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시 총상금은 1억3000만 달러 규모다. 남녀 간 격차는 크지만, 두 투어 모두 거대 시장이다. 지노 티띠꾼(태국)은 758만 달러, 우승 한 번 없는 최혜진도 한 시즌 만에 안세영의 통산 상금과 비슷한 215만 달러를 벌었다.
한국은 정반대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는 구조다. 대회 당 상금 총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대회 수가 남자보다 많다. 남녀가 역전된 이유는 간단하다. 여자 대회가 시청률이 높고, 더 많은 스폰서가 붙기 때문이다.

◆ 유럽 스포츠는 왜 다르게 보일까
자주 언급되는 반론도 있다. "테니스는 남자가 더 인기 있어도 그랜드슬램 대회 남녀 상금은 같지 않은가." 하지만 이건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기보다 합의된 시스템의 '추후 선택'에 가깝다. 테니스 그랜드슬램은 남녀 경기를 같은 기간, 같은 장소, 같은 티켓과 중계 상품으로 묶는다. 팬층이 겹치고, 상품을 분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녀를 같은 레벨의 콘텐츠로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남녀 대회를 같이 여는 배드민턴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가능했던 전제다. 유럽 최고 인기 스포츠인 테니스 시장의 파이는 이미 엄청나게 커졌다. 윔블던은 총상금 7000만 달러,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각각 4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랜드슬램처럼 상징성이 강한 이벤트는 남녀 동등 상금을 통해 젠더 평등과 브랜드 가치를 드러내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흥행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상금 구조 일부를 정치적·문화적 메시지로 쓰는 방식이다. 철저하게 시장 원리를 따르는 미국과 달리 유럽 스포츠가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다.

◆ 안세영 상금 논쟁이 엇나간 지점
최근 국내 보도와 여론의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안세영이 이렇게 잘하는데, 골프·테니스 선수보다 적게 받는다는 말은 언뜻 보면 타당해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설명이 빠져 있다.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차이다. 선수의 노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목이 얼마나 팔리느냐"의 문제다. 불편하지만 결론은 명료하다. 안세영이 더 많은 상금을 받는 길은 하나뿐이다. 배드민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 월드투어 시청률이 오르고, 스폰서가 더 많은 돈을 내고, 팬들이 열광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월드투어는 마니아들만 챙겨본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프로 스포츠급 상금을 요구하는 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세영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다. 문제는 선수도, 제도도 아니다. 안세영이 외롭게 목소리를 내며 바꾸기 원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은 배드민턴 산업의 성장에서 열린다. 우리는 "왜 상금이 적은가"를 묻기 전에 "얼마나 보고 소비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스포츠는 언제나 그렇게 성장해왔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