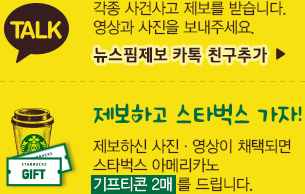[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께서는 앞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가 신흥국들의 시장을 좀 교란시킨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선진국들의 추가양적완화 조치가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양적완화 조치가 나왔을 경우 우리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양적완화조치가 사실 많이 나왔지만 이게 사실 금융기관끼리만 돌고 민간까지는 전파가 안 되면서 그렇게 크게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추가 양적완화조치가 나왔을 경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동성이나 인플레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지, 우리 경제에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 그대로 풀린 돈이 현재 우리 민간에까지 자극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은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매우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이 얼마나 유효하다고 보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의장인 벤 버냉키 또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벤 버냉키는 입에 여러 번 달고 있는 것이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Monetary policy is not a panacea,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마리오 드라기도 지난 번에 ECB에서 월 초에 의사결정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다, 이것하고 중앙은행이 같이 일을 해야지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다른 수단들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경제정책하고 같이 갈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통화정책 자체만으로서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기는 매우 제약적이다, 오늘 아침에 아마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것이 있는데 제목이 중앙은행이 세계를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entral banks can not save the world,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시면 아마 대개 선진국에서 왜 지난번에 양적완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것의 기대를 맞추지만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런 데에 연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것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소위 신흥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제회복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 풀릴수록, 지금은 조금 전에 기자가 질문한 것에도 있습니다만 그 유동성이 실물 부분에 직접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만일에 한번 연계가 되기 시작해서 실물부분에서 경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 유동성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캐피털 플로우, 자본의 이동이 더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우리와 같은 국가에는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계속 양적완화가 유동성만 공급을 하고 실물경제나 또 금융중개기능을 통해서 경제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돈만 쌓이는 거니까 지금 과거에 그런 측면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가 양적완화 정책을 한 것만큼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라.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시장의 의견입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더 하라고. 그러나 더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의 활력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어떠한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이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금 같은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제성장을 기본적으로 회복을 가져올 때까지는 그 효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그럴 겁니다. 왜 같은 변수들이 항상 여러 개 나와서 어떤 경우는 변수A를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변수B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이런 국제회의에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소위 영어로 말하면 무빙 타겟, 타겟이 변한다는 겁니다. 한때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 나라의 소위 금융시스템, 또 은행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런 문제가 됐다가 또 상당히 오랫동안은 유럽 나라들의 재정위기가 됐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천상 세계경제가 다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고 또 모든 부문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를 정태적인, 평화로운 시대에서의 정태적인 그런 분석에 의해서 한 변수만 보고 계속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계속 전염돼가고 움직이니까 우리도 매우 유연한 자세로서 그 움직이는 것에 대처를 해야지, 우리는 두 다리를 땅에 박고 나서 세상은 움직이는데 대처하기 어렵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만의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세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매우 유연하게 또 주의를 기울여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기준금리의 결정에 물론 당연히 하나의 고려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