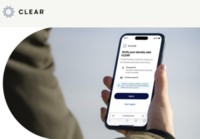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강소연 기자] 배우 소이현을 가리켜 박중훈 감독은 “예쁜데 털털하기까지 하다”고 칭찬했다. 도회적 이미지 탓에 쌀쌀맞을 듯한 소이현이 남자처럼 털털하다니. 하지만 박 감독의 말은 의외로 정확했다.
영화 ‘톱스타’ 개봉을 앞둔 어느 쌀쌀한 아침 배우 소이현(29)을 만났다. 지금껏 봐왔던 세련된 청담동 며느리는 없었다. 성격이 너무 좋아 편하고 뿌듯하다는 소속사 관계자의 제보 역시 사실이었다. 물론 데뷔 당시 팬클럽 임원들이 모두 여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털털한 성격은 충분히 반증됐다.
모든 말 끝에 ‘웃음’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까 난감할 정도로 매 순간 (신기하게도 예쁘게)깔깔거리며 웃었다. 예쁘다는 칭찬에는 애교 가득한 말투로 “에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요”라며 호탕하게 웃는다. 개봉을 앞둔 떨리는 긴장감도 기분 좋은 에너지로 모두 덮어버릴 정도였다.
“꿈이요? 꿈은 안 꿨는데 잠은 좀 설쳤어요. 근데 영화는 진짜 감을 못 잡겠어요. 좋은 영화도 개봉해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희한하게 잘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 영화는 질적으로 자신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배우로서 아쉬운 점보다 기대가 더 큽니다(웃음).”

소이현은 6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에서 신인감독 박중훈의 손을 잡았다.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는 엄태웅과 김민준. 극중 그가 연기한 미나는 타고난 감각과 뛰어난 사업 수완, 미모를 겸비한 인물이다. 두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미나는 매혹적인 캐릭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배우 출신 감독의 작품’이란 타이틀에 따라올 대중의 엄격한 잣대, 배우보다 감독에 더 주목할 언론 등 출연을 망설일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였다.
“그런 부담은 없었어요. 단지 그분 앞에서 연기한다는 부담이 컸죠. ‘톱배우에게 오케이 받을 수 있을까? 연기가 만족스러우실까?’ 싶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역할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또 마음을 고쳐먹은 게 연기 좀 못해도 감독님이 가르쳐주실 거라 믿었죠(웃음). 실제로 감독님이 영화에 대한 팁을 많이 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배우로서 배운 게 너무 많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받고 하는 최고급 레슨이었죠.”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건 영화 속 미나 뿐만이 아니었다. 촬영 현장의 홍일점이던 소이현은 배우들은 물론 감독의 사랑까지 듬뿍 받았다. 게다가 오랜만에 되찾은(?) 막내 자리 덕에 현장 가는 길은 평소보다 즐거웠다. ‘여배우는 무조건 예쁘게 나와야 한다’는 박 감독의 신념 덕도 봤다. 소이현의 말을 빌리자면 스크린을 속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질 정도다.
“제가 찍을 땐 조명도 달랐죠. 지시만 하시던 조명 감독님이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셨어요(웃음). 여배우가 한 명 뿐이라 되게 신경 써 주셨죠. 박 감독님도 엄태웅, 김민준 오빠 왔을 때는 그냥 ‘어. 그래’ 이러시다가 제가 오면 밝게 웃으면서 맞아 주셨어요. 사실 제가 연기한 지 10년이 넘고 아이돌 친구들이랑 많이 하다 보니 최근엔 거의 촬영장 고참이었죠. 근데 오랜만에 꼬맹이 취급을 받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소이현은 올해 막 나이의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다. 조바심이 생길 법도 한데 여유가 넘친다. 오히려 내·외면이 한층 성숙해졌고 더 느긋해졌다며 웃었다. 10년 동안 연기를 해오면서 분명 그는 긍정적인 변화를 겪은 듯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무심결에 던지는 말과 행동은 10년 뒤 더 나은 배우가 될 거란 확신을 줬다. 소이현이 데뷔 때부터 꿈꿔온 배우 나문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말이다.
“한 번도 스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지인들한테 욕심 좀 가지라고 욕도 먹었죠(웃음). 욕심 갖고 좀 더 하면 될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요. 저는 나문희, 김희애 선생님 연기를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사실 그게 더 큰 욕심 아닌가요? 쉽지 않잖아요. 롱런하면서 후배들한테 존경 받으며 연기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정말 그렇게 되고 싶고요. 천천히 한 계단씩 밟아 가면 언젠가는 많은 대중이 저를 연기자, 배우로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새침하다고요? 알고 보면 허당이죠” |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강소연 기자 (kang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