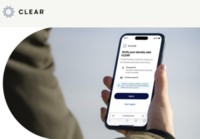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친정부 인사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요직에 앉히는 '낙하산 인사'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 된지 오래다.
특히 금융투자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의 감사, 상임이사, 고문 자리는 낙하산 인사의 단골 보직으로 자리잡았다. 주인이 없는 곳인데다 일이 많지 않고 고액 연봉이 가능해서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크지 않아 선호된다.
현 정권에서도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빈번했다. 최근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2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앉히려다 금융권 안팎의 거센 비판으로 무산됐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내정하려다 취소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면서 '깜깜이' 낙하산 인사를 하려 했다는 점이다.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8월 초 전무급인 투자운용2본부장 자리를 신설하고 공개 채용 절차도 없이 황 전 행정관을 앉히려했다.
예탁원 역시 기존 상임이사 직급 자리가 없었다가 직급을 새로 만들어 선임하려다 금융권 안팎의 거센 비판으로 무산됐다. 조용히 낙하산 인사를 하려다 노조 항의 등으로 막힌 것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특히 전문성을 요한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운용, 금융 전문가들이 수두룩한 이유다. 과거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과거 경력과 비슷한 업종이나 전공이라도 일치하는 기관에 낙하산을 내려보냈지만, 현 정권에선 막무가내식 무경력, 무경험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친 친정부 인사고, 한 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금융분야 경력은 전무하다.
그동안 금융권은 낙하산 인사의 '텃밭'이 된지 오래다. 최근 금융결제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낙하산 상임이사 내정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 정권 출범 후 지난해 11월까지 주요 39개 금융기관의 임원 138명 중 32%가 친정권 인사, 퇴직관료 등 낙하산 인사였다.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집권 초 공언했던 '낙하산 인사 근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맥락없는 보은인사는 멈추길 바란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