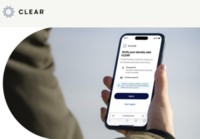강하늘을 만나기로 한 새벽,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에스타디오 베이라-리오 구장에서 벌어진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알제리전에서 2-4로 패했다. 바쁜 일정 속에도 축구를 챙겨본 그의 얼굴에도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고생한 태극전사들에게 위로를 건넬 줄 아는 그다. 마주한 강하늘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이기보다는 다정한 효신선배(드라마 ‘상속자들’) 혹은 박동주(드라마 ‘엔젤아이즈’)와 많이 닮아 있었다.
배우 강하늘이 첫 스크린 주연작 ‘소녀괴담’을 들고 대중 앞에 섰다. 영화는 귀신을 보는 외톨이 소년 인수가 기억을 잃은 소녀 귀신을 만나 우정을 나누면서 학교에 떠도는 핏빛 마스크 괴담과 반 친구들의 연쇄 실종, 그리고 소녀귀신(김소은)에 얽힌 비밀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극중 강하늘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언제나 외톨이로 지내는 소년 인수를 연기했다.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워낙 예산이 적어 하루 안에 찍어야 하는 분량은 모두 소화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훌륭하게 나왔어요.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 현장은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배우들 성향이 다 잘 맞고 한 명도 모난 사람이 없었죠. 진심으로 다 같이 머리 싸매면서 고생했고, 함께 힘을 쏟는 과정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현장이 또 있을까 싶어요(웃음).”

‘소녀괴담’은 공포영화지만 그 속에 애틋한 감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일반 공포물과 다르다. 처음 시나리오를 보고 섬뜩하고 잔인한 공포영화가 아닌 영화 ‘늑대소년’(2012)과 ‘렛미인’(2008)이 떠올랐다는 강하늘 역시 영화의 이런 면에 이끌려 출연을 결심했다.
“사실 공포영화가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공포만을 위한 공포영화, 무서움만 주는 시나리오가 대부분인데 이건 확실히 달랐죠. 그래서 감독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그거라고 하셨어요. 드라마가 주가 되는 공포, 감성 공포를 지향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 다른 영화와 차별화시켰죠.”
영화를 보고 있자면 인수에서 실제 강하늘이 꽤 많이 겹쳐보인다. 스크린 속 인수는 소극적인 캐릭터지만, 역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다. 순순히 사실을 인정(?)한 강하늘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혹은 혼자 있는 자신을 인수 캐릭터에 투영했다”며 웃었다.
“제가 진짜 편한 사람을 만나면 말 수가 없고, 별 말없이 멍하니 있곤 하거든요. 그리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죠. 오히려 내향적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내성적이진 않아요. 이런 성격 특징이 자기 생각이나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죠(웃음).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중간 지점을 찾게 되는 듯해요.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온전히 집중하되 사람을 대할 때는 나름의 마음가짐이나 말투 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애늙이라는 별명도 붙었더라고요(웃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근조근 말을 풀어놓는 그의 취미는 (예상을 크게 뒤엎지 않는)노래 부르기와 독서다. 수필이나 자기계발서보다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소설과 여행기가 좋고, 가사가 있는 노래보다 지브리 작품에 삽입된 연주곡을 즐겨 듣는다. 생각하는 시간과 생각할 여지를 두는 게 그에게는 꽤나 중요하다.
“시끌시끌한 상황을 원할 때도 있어요. 손에 꼽을 정도지만 일 년에 한 번 정도 클럽도 가죠(웃음). 술은 요즘엔 자제 중인데…소주 3병 정도 마셔요. 그런데 전 이런 걸로 스트레스가 풀리진 않더라고요.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는 초 켜놓고 하늘 보면서 노래 듣는 거예요. 그러다 잠들기도 하고요. 혹은 노래를 들으면서 자전거 타고 원하는 장소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 막힌 게 뻥 뚫린 기분이죠.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최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하늘은 요즘 사색을 즐길 시간도 없어 보인다. 해가 바뀌면서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지난 2월 한 달은 ‘소녀괴담’을 촬영했고 봄엔 SBS 드라마 ‘엔젤아이즈’로 시청자를 만났다. 게다가 지금은 대전과 문경을 오가며 영화 ‘쎄시봉’과 ‘순수의 시대’를 촬영하고 있다. 거기다 7월 중순부터는 영화 ‘스물’ 촬영을 시작한다.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던, 컴퓨터 용량이 차고 넘쳐도 정우성 주연의 영화 ‘비트’(1997)와 ‘태양은 없다’(1998)를 지우지 못하던 그는 어느새 한국의 빌 나이를 꿈꾸는 ‘대세’가 됐다.
“제가 부담스럽게 잘생겼거나 연기를 빼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편안함이 있는 듯해요. 추구하는 연기관도 연기를 잘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강물 흐르듯 그 안에서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사실 많이 찾아주시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여기에 운도 따랐다는 걸. 그래서 이 운이 다했을 때, 아무런 거품 없이 저를 온전히 봐주실 때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날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힘, 친구” |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