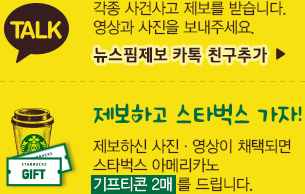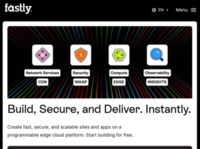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겉으로 보면 심리전의 한 형태지만, 대응 과정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군사·정치적 판단이 얽힌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추진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제동했다는 전언은 그 긴장감을 잘 보여준다. 공식 확인된 기록은 없지만, 관계자들이 전하는 정황은 다소 구체적이다.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김 전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한 '쓰레기 풍선' 사태에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확고한 대비태세가 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대응계획을 점검했고, "다음 풍선이 오면 원점 타격을 건의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다만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는 언급이 덧붙었다고 한다.
작전본부장은 '원점 타격은 대통령·안보실장 승인과 유엔사 통보가 필수'라는 절차를 들어 반대했고, 합참의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합참의장 역시 동의하며, 실제 건의가 있으면 화상회의를 중단하고 안보실과 공유하자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법률과 동맹 규범을 무시한 즉흥적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이 됐다.
며칠 뒤 김 전 장관은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다녀온 직후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11월 22일 합참의장이 직접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김 전 장관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11월 말 다시 풍선 부양 보고가 있었을 때, 김 전 장관은 합참 본부장을 질책했으나 실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합참은 절차를 재정비했다. 장관의 단독 결심만으로 실행할 수 없도록, 국방부·합참·작전지휘관이 함께 논의하고 승인하며, 이후 유엔사 통보까지 거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법률·동맹 의무·지휘 체계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군사적 긴급성보다는 '독단 방지'와 '외교적 파장 관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원점 타격은 강력한 억제 수단이지만, 동시에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몰고 갈 수 있다. 특히 북측 영토나 DMZ 이북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정상 민감한 사안이다. 무력 사용에 앞서 정치적·외교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군사작전의 기본 원칙이며 돌발 사태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합참의 반대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12월 3일 계엄 선포에서 합참이 제외된 배경을 두고 '원점 타격 저지'와 연관 짓는 해석이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 다만,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합참의 태도는 군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적 결심이 과열될 때 이를 제어하는 것은 비단 군 지휘부의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군사작전은 속도와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속도는 대응의 즉각성을 보장하지만, 절차는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막는다. 당시 합참이 선택한 쪽은 후자였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신중함이 성급함을 눌렀다. 그 판단이야말로 위험을 막았다는 점에서 군의 존재 이유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