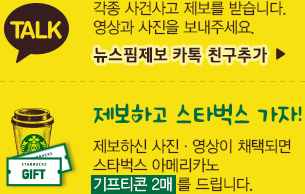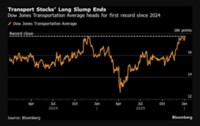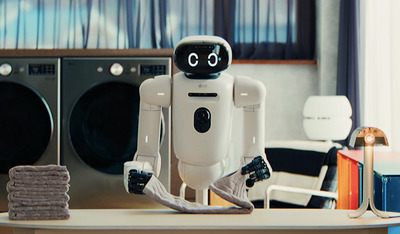대기업 자금 조달 새 길 열어야, 특혜 논란은 넘어야 할 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의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은 지금 도약의 문턱에 서 있다. 오픈AI가 삼성과 SK에 월 90만장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요청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기존 생산 능력의 두 배에 달하는 증설 압박에 직면했다. AI 확산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글로벌 투자 경쟁을 촉발했고,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천문학적 자금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제는 조달 방식이다. 국내 기업들은 유보금, 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을 통해 꾸준히 투자를 이어왔지만, 이 방식으로는 수십, 수백조 원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실행하기 어렵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고, 미국도 은행 소유만 제한할 뿐 산업자본의 펀드 운용을 허용한다. 한국만 43년 된 규제에 묶여 글로벌 자본을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지점에서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규제가 풀리면 삼성·SK 같은 대기업이 직접 펀드 운용사(GP) 역할을 맡아 글로벌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 세계 초대형 자본이 한국의 전략산업에 유입되면 반도체 공장 증설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현실화되고, 기업은 자체 자금을 연구개발과 신산업으로 돌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형 메가펀드'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전제가 있다. 금산분리 완화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나 불공정 지원으로 귀결된다면 '재벌 특혜'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제도의 개편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건부 변화여야 하며, 대기업은 확보한 자금을 국내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얻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AI와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 자산이다. 금산분리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판을 다시 짜는 제도적 실험이다. 이 기회를 도약으로 만들지, 특혜 논란으로 소모할지는 결국 기업의 책임 있는 선택과 정치의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