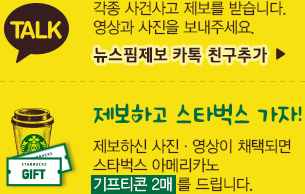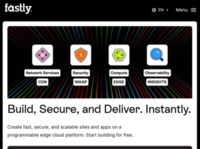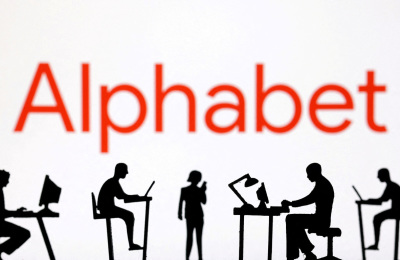국내 수주 기회 축소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글로벌 빅파마들이 잇따라 미국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아직 의약품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데다 미국 현지 공장이 구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의 롭 데이비스 CEO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 2018년 이후 미국 내 제조시설에 12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추가로 9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로슈도 향후 5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13개 제조시설과 15개 연구개발(R&D) 센터를 확장 및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디애나와 펜실베니아 등에 생산시설을 짓고, AI 기반의 R&D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의약품 수입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현지 생산 강화 조치로, 로슈는 미국 내에서 1만20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바티스 또한 미국 내 10개 시설에 5년간 230억 달러를 투자해 6개의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3개 시설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 판매 의약품의 100%를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화이자도 기존 미국 내 13개 제조시설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라이 릴리 또한 향후 5년 간 미국 내 4개의 신규 생산시설에 2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35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생산시설 등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 정부가 의약품 관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미국의 의약품 관세 압박이 커지자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정부의 자국 내 의약품 생산 확대 정책과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으로 둔 CDMO 사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기조가 강화되면 수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미국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선경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진출을 3~4년 전부터 검토했으나, 최근 대두된 관세 이슈 때문은 아니며 해외 공급망을 생각해 고려한 것으로 스탠스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관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요소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CDMO 업계 관계자는 "관세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미국 현지 건설비와 인건비가 국내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장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 짓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전무)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는 장기적으로 국내 CDMO 업계에 좋지 않다"며 "국내 CDMO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