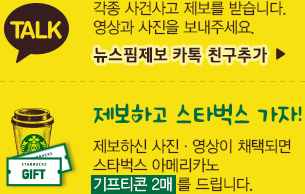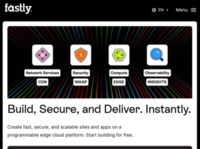리튬이온 배터리 탓…전기차 열폭주 원인
재생에너지 저장에도 활용…설치 확대 전망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됐다. 불이 난 시각은 26일 오후 8시 15분경. 초진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완전 진화는 27일 오후 6시경 이뤄졌다. 완진까지 하루 가까이 걸린 이유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때문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효율적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1000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셀 단위로 연쇄적으로 번져 진압이 어려운 것도 특징이다. 소방청 등 전문가들은 냉각을 위한 다량의 물이나 수조에 담가 배터리 온도를 낮추는 방법 외에는 효과적인 진화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역시 발화 시작점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해당 사고로 차량 959대가 타거나 그을렸다. 사고액은 부동산 24억원, 동산 14억원 총 38억원으로 집계됐다. 리튬이온 포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매년 증가세다. 2020년 292건에서 2024년 543건으로 5년간 매년 증가했다. 재산 피해는 같은 기간 45억6000만원에서 260억원으로 4년 만에 5.7배 급증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활용된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할 수 있기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높이겠다고 정한 바 있다. ESS 확대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ESS 화재는 55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필요성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2014년 설치된 해당 배터리는 권장 사용연한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으며, 적기 교체 및 점검이 미흡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인재가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한다. 작업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했고,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을 분리해 전기 단락(쇼트) 사고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ESS 설치 과정에서의 안전 규정 숙지와 전문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산업 혁신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향하고 있는 현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이같이 허술하다면 값비싼 대가를 매번 치를 수밖에 없다. 소방청과 전문가들은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비 점검, 현장 안전교육, 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업계가 산업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문화 확립에 힘써야 중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배터리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정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첨단기술의 편리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클라우드 이중화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4차 산업혁명,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뒤에서 배터리 안전 확보와 사고 대응 체계의 확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숙제로 남는다.
sheep@newspim.com